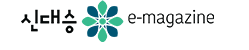[분석] 태국 불교의 승왕 추대 파동과 '국교화' 운동의 광기- 1편
국제연대 - 크세 연구회 | 2016. 제1호좌절한 양극화 사회의 기성 종교가 벌이는 현실 정치의 대리전
군사정권 치하의 태국이 사회 경제적 활력을 상실하면서 비교적 조용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불교계만큼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럽다. 태국 불교의 수장인 승왕(Supreme Patriarch, 쌍카랏[สังฆราช, sangha-raja]) 선출을 두고 발생한 이 분규는, 급기야 2월16일(월)에는 승려들의 시위와 몸싸움 모습까지 노출하면서 국제언론의 주목도 받았다. 이들은 "정부는 종교에 개입하지 말고" 승단이 선출한 승왕 후보자의 인준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태국에선 보기 드문 승려들의 몸싸움 모습으로 인해 승왕 임명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 내막은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태국의 '승왕'(쌍까랏)은 남방상좌부(일명: 소승불교) 전통의 양대 종단인 마하 니까야(Maha Nikaya)와 탐마윳 니까야(Dhammayuttika Nikaya, 담마윳띠까) 모두를 대표하며 30만명에 달하는 태국 승려 전체의 수장으로서, <승가법>에 따라 '승가 최고회의'(Supreme Sangha Council: SSC)에서 추대된 후, 총리의 임명 제청과 국왕의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된다.
태국 사회는 최근 몇년 간 승왕직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2013년 10월 세수 100세로 입적한 니야나상와라 수와다나(Nyanasamvara Suvaddhana, 솜뎃 프라 냐냐상완[สมเด็จพระญาณสังวร]: 1913~2013) 승왕은 무려 24년간 승왕의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니야나상와라 승왕은 말년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2004년부터는 솜뎃 끼야우(Somdet Kiaw: 1928~2013) 스님이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그는 니야나상와라 승왕보다 2달 앞선 시점인 2013년 8월에 사망했다.
솜뎃 끼야우 스님의 뒤를 이은 인물은 솜뎃 프라 마하라차몽칼라찬(Somdet Phra Maharatchamong khalachan, 솜뎃 추웡[Somdet Chuang]: 1925년생) 스님으로서, 대형 사찰 '왓 빡남 파시짜른'(Wat Pak Nam Phasi Charoen)의 주지이다. 그는 솜뎃 끼야우 직무대행이 사망한 후부터 직무대행을 수행하다 2014년 1월 '승가 최고회의'에서 새로운 승왕으로 지명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2014년 5월에 발생한 쿠데타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왕의 인준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후 승단 내부의 갈등과 부패 폭로전 속에서 승왕 추대 절차는 정체 상태에 있었다.
솜뎃 추웡 스님은 온갖 비난과 공격 속에도 여전히 승왕 권한대행 직을 유지하면서 '승가 최고회의' 의장도 겸직해왔다. 금년 1월11일 '승가 최고회의'는 8명의 후보자 중 솜뎃 추웡 스님을 승왕으로 추대한다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 결정은 태국 불교의 최고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확전되고 있다.
불교의 정치화 : '레드 불교' 대 '옐로 불교' ?
일부 개혁주의자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20세기의 태국 불교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전통적인 기득권 체제의 영적 토대였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불교계는 새로운 양상의 정치적 갈등에 봉착했다.
태국은 이동통신 재벌 출신 정치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1949년생) 총리의 시대로 21세기를 시작했다. 탁신은 태국 역사상 최초로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총리가 됐고, 2005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둬 재선됐다. 그의 제1기 임기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그는 특히 태국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빈곤층에 돌려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했다. 북부 및 북동부 지방 농민과 도시 빈민층들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탁신 이전에는 정치인들의 관심 밖이었다. 남부지방 무슬림 소요사태와 마약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학살과 인권유린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탁신 정권은 저금리 농경자금 대출 등 경제적 지원정책과 30바트 의료정책 등 복지정책을 통해 기층에서 열광적 지지와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닦았다.
하지만 탁신의 정치적 성공은 왕당파, 군부, 사법부, 방콕 중심의 중상류층 등 전통적인 기득권 계층과 고무농사를 중심으로 상대적 풍요를 누리던 태국 남부지방 사람들에겐 위협으로 간주됐다. 그들은 곧 반발하기 시작했다. 방콕에서 중상류층 대중이 대규모 시위로 바람을 잡고 군부 쿠데타(2006년 및 2014년)로 정리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은 친-탁신계 정권을 3번이나 연속으로 전복시켰다. 이 과정에서 태국은 '레드셔츠'(UDD)와 '옐로셔츠'(PAD)로 상징되는 첨예한 "컬러" 양극화 사회가 됐다. '레드셔츠 운동'은 친-탁신 성향의 북부/북동부 지방 농민 및 도시 노동자 중심 대중운동이고, '옐로셔츠 운동'은 반-탁신 성향 방콕/남부지방 중심 중상류층의 대중운동이다. (이 중 '옐로셔츠 운동'은 테러나 다름없는 '국제공항 점거사태'라든지 "민주주의 반대"라는 비상식적 주장 등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실추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지개 셔츠 운동'이나 '멀티컬러 운동' 등으로 외투를 갈아입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0년 이후 친-탁신 진영은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고, 그때마다 반-탁신 진영은 쿠데타나 사법부의 선거무효 판결 등을 통해 정권을 붕괴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양 진영의 대립은 너무도 첨예하여, 이제 내전의 발발조차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됐다.
불교계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승왕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태국 정치의 양대 진영이 펼치는 싸움의 완벽한 대리전이다. '옐로셔츠' 진영이 친-탁신 성향의 승왕 추대를 반대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승왕 대행 솜뎃 끼야우 스님 역시 '옐로셔츠 운동'을 창시한 언론재벌 손티 림텅꾼(Sondhi Limthongkul: 1947년생)의 반대에 시달렸고, "살아있는 아라한"(생불)로 불리던 루웡따 마하 부워(Luangta Maha Bua: 1913-2011) 스님으로부터도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었다. 마하 부워 스님은 'IMF 채무 반환 모금운동'을 주도하면서 초기에는 탁신 정권과 관계가 좋았지만, 이후 반-탁신의 입장으로 돌아서서 솜뎃 끼야우 승왕 대행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솜뎃 추웡 현 승왕 대행의 추대 파동 역시 동일한 구도이지만,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번에도 표면에는 부패 의혹이 불거져 있지만, 현 승왕 대행의 지지자들은 반대파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동기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솜뎃 추웡 승왕 대행은 '왓 프라 탐마까이(담마까야)'(Wat Phra Dhammakaya) 사원과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왓 탐마까이 사원'은 "친-탁신 사원"으로 인식되는 사찰이다. 따라서 불교계의 갈등은 표면상 솜뎃 추웡 승왕 후보자 개인에 대한 찬반 논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왓 탐마까이 사원' 세력과 불교계 내의 범-보수파 사이의 싸움이며, 넓게 보면 친-탁신 진영과 반-탁신 진영의 대리전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태국이 "사실상의" 불교국가란 점을 감안하면, 불교계의 첨예한 갈등은 국가체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 크세 연구회
-
크세 연구회는 2009년 결성된 동남아시아 전문 온라인 연구공동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