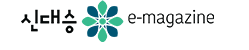서울, 길을 걷다-8.백악과 백석동천 길<1>
인문/기행 - 최연 (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 2016. 제4호
사진(필자제공): 인왕산에서 바라본 백악
백악(白岳)은 한양도읍(漢陽都邑)의 주산(主山)으로 내사산(內四山) 중에서 북쪽에 위치하며 달리 면악(面岳), 공극산(拱極山)으로도 불립니다.
백악이라 함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백악산신(白岳山神)을 모시고 진국백(鎭國伯)에 봉하였기에 신사의 이름을 따라 백악으로 불렀고, 면악은 고려시대에 불리던 이름으로 남경(南京)을 설치하려고 궁궐터를 찾던 중 “삼각산의 면악 남쪽이 좋은 터”라는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면악 남쪽에 남경의 궁궐인 연흥전(延興殿)을 지은 것으로 보이며 그곳이 지금의 청와대 자리이고 면악은 바로 지금의 북악을 일컫는 것입니다.
공극산이라 함은 명나라 사신 공용경(龔用卿)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백악을 ‘북쪽 끝을 끼고 있다.’ 라는 뜻으로 공극(拱極)이라 이름지어준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도성 안 경치 으뜸의 골짜기, 삼청동천
백악은 세 개의 수려한 골짜기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악의 서쪽 사면을 흘러내려 경복궁의 오른쪽을 휘감아 흐르는 백운동천(白雲洞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백악의 동쪽 사면을 흘러내려 경복궁의 왼쪽을 휘감아 흐르는 삼청동천(三淸洞天)이며 마지막으로는 도성 밖인 백악의 북서쪽사면을 흐르는 백석동천(白石洞天)입니다.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은 도성안의 청계천(淸溪川)으로 흘러들고 백석동천은 도성 밖 홍제천(弘濟川)으로 흘러듭니다.
도성 안의 경치 좋은 다섯 골짜기로 인왕산 아래 옥류동천, 백악의 동쪽과 서쪽에 삼청동천과 백운동천, 낙산의 서쪽 쌍계동천, 목멱산 북쪽의 청학동천을 일컫는데 그중에서도 삼청동천을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삼청(三淸)이란 이름은 도교(道敎)의 태청(太淸), 상청(上淸), 옥청(玉淸)을 모시는 삼청전(三淸殿)이 있었던 곳이라 붙여졌다고도 하고 달리 산 맑고(山淸), 물 맑고(水淸), 사는 사람 또한 맑아서(人淸) 붙여졌다고도 합니다.
삼청동천의 다른 이름으로 국무총리 공관 건너편 바위에 삼청동문(三淸洞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숙종 8년(1682년)에 명필가인 김경문(金敬文)이 쓴 것으로 400여년이나 되는 문화유산입니다만 지금은 아쉽게도 건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고 까치발을 하거나 발돋움하면 글씨의 윗부분만 조금 보일 뿐입니다.
수려한 골짜기를 일컬어 흔히 동천(東天)이라하고 달리 동천(洞川), 동문(同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같은 물줄기에 기대어 사는 자연부락을 일러 동(洞)이라 부른데서 연유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천에 하늘 천(天)자를 사용한 것은 수려한 골짜기에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선(神仙)들도 하늘에서 그곳에 내려와 노닐었기에 그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삼청동천에는 옥호정(玉壺亭)이라는 김유근의 별서(別墅)가 있었는데 순조의 장인으로 외척 세도정치를 편 안동김씨 김조순(金祖淳)이 자기의 별서로 사용하다가 아들인 김유근에게 물려준 것으로 삼청동 길의 서쪽 언덕 위, 현재 칠보사(七寶寺)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삼청동의 동쪽 골짜기와 서쪽 골짜기 사이에는 서촌(西村)의 다섯 사정(射亭)의 하나로 꼽히던 운룡정(雲龍亭)이라는 활터가 있었으나 지금은 바위에 새겨진 ‘雲龍亭’ 이라는 세 글자로만 옛 자취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촌 5사정이라 함은 삼청동의 운룡정을 비롯하여 옥인동의 등룡정(登龍亭), 사직동의 대송정(大松亭/太極亭이라고도 함)과 등과정(登科亭) 그리고 누상동의 백호정(白虎亭/風嘯亭이라고도 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삼청동천을 벗어나 동쪽 언덕 위에 올라서면 북촌(北村)의 정겨운 한옥들이 즐비하고 최근에는 대부분 리모델링한 조그만 박물관들이 주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볼거리를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이곳을 ‘북촌의 모습’이라고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지금의 북촌은 일제시대 한옥마을로 개발
원래 한양의 북촌(北村)이라 함은 출사(出仕)한 사대부들이 사는 곳으로 그 사대부들의 집은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행랑채의 많은 칸(間)수의 집이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집터로는 종로구청 자리가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의 집터였고 헌법재판소 자리가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주역 홍영식(洪英植)의 집터였으니 그 규모를 능히 짐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의 높은 산등성이에 들어선 작은 한옥들은 일본 강점기인 1930년대에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종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익선동과 함께 주택경영회사를 운영하던 정세권이 도시형 한옥마을로 개발한 곳으로 한옥의 형태는 서민들의 삶에 맞게 변형된 퓨전형식으로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 외에 지금의 아파트 평면처럼 네모난 모양도 있어 일제 강점기 시대의 변형된 다양한 한옥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집단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산줄기가 백성들이 궁궐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한 궁궐에 딸린 정원인 유원(囿園)이 있었던 자리였기에 시설물이 없는 공터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언덕과 이어진 삼청공원을 지나 북쪽 능선을 오르면 비로소 백악의 품에 들게 되며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한양도성의 북대문(北大門)인 숙정문(肅靖門)으로 원래의 이름은 숙청문(肅淸門)이었습니다. (백악과 백석동천 길 2편으로 이어집니다.)
백악(白岳)은 한양도읍(漢陽都邑)의 주산(主山)으로 내사산(內四山) 중에서 북쪽에 위치하며
달리 면악(面岳), 공극산(拱極山)으로도 불립니다.
백악이라 함은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백악산신(白岳山神)을 모시고 진국백(鎭國伯)에 봉하였기에 신사의 이름을 따라 백악으로 불렀고, 면악은 고려시대에 불리던 이름으로 남경(南京)을 설치하려고 궁궐터를 찾던 중 “삼각산의 면악 남쪽이 좋은 터”라는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면악 남쪽에 남경의 궁궐인 연흥전(延興殿)을 지은 것으로 보이며 그곳이 지금의 청와대 자리이고 면악은 바로 지금의 북악을 일컫는 것입니다.
공극산이라 함은 명나라 사신 공용경(龔用卿)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백악을 ‘북쪽 끝을 끼고 있다.’ 라는 뜻으로 공극(拱極)이라 이름지어준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백악과 백석동천 길 2편으로 이어집니다.)

- 최연 (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
젊은 시절 불교사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참으로 오랜 세월을 몸부림치다가, 혹여 변화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치에 잠시 기웃거리다가 나와서, 인문학에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 옛 동지들이 신대승의 기치를 내걸어 그 길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위해 국민운동체인 ‘민주주의 국민행동’ 기획위원장,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생존을 위해 사단법인 ‘해아라’이사장, 프레시안 인문학습원 서울학교, 고을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