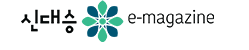서울, 길을 걷다 - 1.한반도 열두 우두머리 산, 삼각산
인문/기행 - 최연 (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 2016. 제1호



동양에서는 세상 만물을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의 유기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때 맞춰 햇빛과 비와 바람을 내려주고(天時), 땅은 하늘이 내려준 기운(氣運)으로 자양분(滋養分)을 만들어 인간을 비롯한 땅에 기대어 사는 ‘뭇 생명’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地利), 사람은 하늘과 땅이 베푼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서 더불어 일하고, 나누고, 즐기며 화목하게(人和)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에서 “대저 살 터를 잡는 데에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生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 인심(人心)이 좋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우리 선조들은 산과 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합당한 이치(理致)와, 그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풍요로운 수확(收穫)과,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이웃들의 정겨움과, 보아서 좋고 노닐어서 더욱 좋은 수려한 산천경계가 함께 갖추어진 곳을 이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은 크게 보아 산(山)과 강(江)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산줄기 사이로 물길 하나 있고, 두 물길 사이로 산줄기 하나 있듯이, 산과 강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맞물린 역상(逆像)관계이며 또한 상생(相生)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산과 강을 합쳐 강산(江山), 산천(山川) 또는 산하(山河)라고 부릅니다.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山自分水嶺)”라는 <산경표(山經表)>의 명제에 따르면 산줄기는 물길의 울타리며 물길은 두 산줄기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 산줄기가 만나는 곳에서 발원한 물길은 그 두 산줄기가 에워싼 곳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같은 곳에서 시작된 함께 흐르는 물줄기(水 同)’라는 뜻으로 동(洞)자를 사용하여 동천(洞天)이라 하며 달리 동천(洞川), 동문(洞門)으로도 부릅니다.
사람들은 동천 주변에서 산줄기에 기대고 물길에 안기어(背山臨水) 삶의 터전인 ‘마을(村)’을 이루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볼 때 산줄기는 울타리며 경계인데 물길은 마당이며 중심입니다. 산줄기는 마을의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데 물길은 마을 안의 이쪽저쪽을 나눕니다. 마을사람들은 산이 건너지 못하는 물길의 이쪽저쪽을 나루(津)로 건너고, 물이 넘지 못하는 산줄기의 안쪽과 바깥쪽은 고개(嶺)로 넘습니다. 그래서 나루와 고개는 마을사람들의 ‘소통(疏通)의 장(場)’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희망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마을’은 예로부터 ‘말’이라고 줄여서 친근하게 ‘양지말’ ‘안말’ ‘샛터말’ ‘동녘말’로 불려오다가 이제는 모두 한자말로 바뀌어 ‘양촌(陽村)’ ‘내촌(內村)’ ‘신촌(新村)’ ‘동촌(東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물줄기(洞天)에 기댄 자연부락으로서의 삶의 터전을 ‘마을’이라 하고 여러 마을들을 합쳐서 보다 넓은 삶의 터전을 이룬 것을 ‘고을’이라 하며 고을은 마을의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루는 큰 물줄기(流域)에 기대고 있습니다.


서울이 수도(首都)가 된 것은 조선의 도읍(都邑) 한양(漢陽)이었기에 그러하였고 한양이 조선의 도읍으로 선택된 것은 삼각산(三角山)이 부려놓은 터전이 풍수 지리적으로 예사롭지 않았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 중에 최고의 격(格)을 나타내는 12종산(宗山)에 삼각산도 포함됩니다.
백두산, 원산, 두류산, 낭림산, 분수치, 태백산, 속리산, 장안산, 지리산은 모두 백두대간 상의 분기점이라는 조종(祖宗)적 위치인데 비해 삼각산은 금강산, 오대산과 더불어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산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천하명산 금강산(金剛山)이야 중원(中原)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고 오대산(五臺山)은 불법(佛法)의 보고이니 종산이 되고도 남을 것이나 삼각산은 이도 저도 아니면서 종산이 된 이유는 그 부려놓은 터가 도읍지로서 충분할 정도의 명산이었기에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백두대간(白頭大幹) 상의 분수치에서 갈려 나온 한북정맥(漢北正脈)이 적근산, 대성산, 광덕산, 지나 광덕고개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솟구쳐 백운산, 국망봉, 청계산, 운악산을 지나며 높낮이를 이어 오다가 포천과 의정부를 넘나드는 축석고개에서 그 높이를 현저히 낮추고 불곡산, 도봉산을 지나 영봉(靈峰)에 이르러 정맥의 본줄기는 서향하여 노고산 지나 장명산에서 서해로 숨어들고 다른 한줄기는 남쪽으로 그 방향을 돌려 삼각산(三角山), 즉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을 일구고 보현봉(普賢峰)에 이르러 동남향하면서 형제봉(兄弟峰), 보토현(補土峴), 구준봉(狗蹲峰)을 지나 마침내 한양(漢陽)의 주산(主山)인 백악(白岳)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산줄기의 흐름을 풍수 지리적으로는 내룡(來龍)이라고 하는데 산의 기운(氣運)이 산줄기(龍)의 뻗침과 함께 전해져 온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헌걸찬 정기(精氣)가 산줄기의 뻗음을 타고 한양의 주산인 백악으로 이어져 그 기운을 한양 도읍에 불어 넣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무척 넓고 깊습니다.
서울이 역사적으로 크게 부각된 것은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한강유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였을 때로 한반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은 꼭 차지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서울은 고려시대에는 남쪽의 수도라는 뜻의 남경(南京)이었으며, 조선 개국 후에는 개성에서 천도, 새로운 수도 한양(漢陽)이 세워졌던 곳이며,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망국(亡國)의 한을 고스란히 감당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일본에 합병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곳도 서울입니다.
이렇듯 서울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각 시대의 문화유적의 보고(寶庫)이며 개항 이후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펼쳐 놓은 근대문화유산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어 서울이 이룩해 놓은 역사 문화유산은 그 넓이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만큼 온전하게 제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곳도 서울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었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의도적으로 우리 문화를 파괴, 왜곡시켰으며 한국전쟁으로 또 다시 초토화 되었는데 그나마 남아 있던 문화유산은 개발독재세력의 산업화와 개발의 논리에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금 접하고 있는 서울의 문화유산은 점(點)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 모아 선(線)으로 연결하고, 그 선들을 쌓아서 면(面)을 만들고, 그 면들을 세워 입체의 온전한 서울 문화유산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비록 역사유물은 전해지지 않더라도 신화, 전설, 역사서, 지리지, 세시풍속기, 풍수지리지 등 많은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만, 그 기록들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은 '역사적 상상력'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화유산의 보고인 서울, 그 길을 함께 나서는 길동무(道伴)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입체적인 ‘서울이야기’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

- 최연 (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
젊은 시절 불교사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참으로 오랜 세월을 몸부림치다가, 혹여 변화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치에 잠시 기웃거리다가 나와서, 인문학에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 옛 동지들이 신대승의 기치를 내걸어 그 길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위해 국민운동체인 ‘민주주의 국민행동’ 기획위원장,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생존을 위해 사단법인 ‘해아라’이사장, 프레시안 인문학습원 서울학교, 고을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