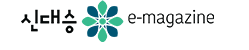서울, 길을 걷다 - 4. 문제 많은 한양에 도성을 정한 까닭은?
인문/기행 - 최연 (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 2016. 제2호
다음으로 내사산의 산세를 살펴보면 주산인 백악에서 왼쪽으로 동향(東向)하는 응봉과 타락산의 산줄기를 좌청룡이라 하고 오른쪽으로 서향(西向)하는 인왕산의 산줄기를 우백호라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좌청룡 보다 우백호가 우람하고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수 지리적으로 좌청룡은 적자(嫡子) 장자(長子)를 뜻하고 우백호는 서자(庶子) 지손(支孫)을 상징하며 불교에서도 좌(左)는 체(体)요 우(右)는 용(用)을 의미해 왼쪽을 근본으로 오른쪽을 쓰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조선 오백년 동안 장자가 임금이 된 경우가 7명뿐인데 문종은 2년, 단종은 3년, 연산군은 11년을 보위에 있었으나 결국 폐위됐으며, 인종은 9개월, 현종이 15년, 숙종이 45년으로 제일 오래 왕위에 있었으며, 경종 4년으로 제대로 왕 노릇을 한 임금은 현종과 숙종 뿐입니다.
그리고 적국으로 견주어지는 안산(案山)으로서의 목멱산은 주산인 백악과 너무 가까이 있고 그 위세 또한 주산보다 강하여 늘 주변국의 침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이렇듯이 문제가 많은 풍수적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왜 굳이 이렇게 도읍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교 이념에 기초한 도읍의 건설이라는 대의를 가진 삼봉 정도전(鄭道傳)의 고집 때문으로 일설에 의하면 궁궐의 좌향(坐向)에 대하여 삼봉(三峰)과 무학(無學)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대군주가 살고 있는 궁궐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를 향하는가(坐向)는 도읍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궁궐의 방향을 놓고 논쟁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도 주군은 배북남면하여 통치를 함으로 궁궐의 좌향(坐向)은 남향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한양의 으뜸산 삼각산/사진: 필자 제공
이에 반하여 무학(無學)은 다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으뜸산인 조산(朝山)은 삼각산으로 하고 인왕산을 주산(主山)으로 삼고 백악(白岳)을 좌청룡, 목멱산(木覓山)을 우백호, 낙산(洛山)을 안산(案山)으로 삼아 궁궐이 동쪽을 바라보는 좌향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궁궐터는 지금의 사직단과 배화여대 어름쯤 될 것이며 주산으로서의 인왕산은 북악 같이 푸석돌이 아니라 단단한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마주보는 안산(案山)인 낙산보다 매우 높고 세력도 출중해 능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고 적자(嫡子)와 장자(長子)를 뜻하는 좌청룡인 백악과 지손(支孫)과 서자(庶子)를 뜻하는 우백호인 목멱산을 비교해 볼 때 좌청룡의 기세가 크고 길어 장남이 그 아우들을 세력으로 능히 아우를 수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학의 대안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혁명에 성공한 일등개국공신인 삼봉(三峰)과 몰락한 왕조의 지배이념이었던 불교의 왕사인 무학(無學)의 정치적 입지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봉(三峰) 정도전과 무학(無學) 대사의 궁궐의 좌향(坐向)에 대한 논란은 의상(義湘)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산(漢山)은 금국(金局)이라서 궁궐을 반드시 동향(東向)으로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쇠약해진다. 터를 고르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동쪽은 허(虛)하고 남쪽은 낮으니 북악산 아래 터를 잡지마라.
검은 옷을 입은 도적(倭賊)이 동쪽에서 쳐들어올까 두렵다.
도읍을 정하려는 자가 스님 말을 들으면 나라의 운수가 좀 연장된다.
그러나 만약 정(鄭)씨 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걸면 5대도 못가서 왕위를 뺏는 변고가 생기리라. 또 2백년 후에는 대환란이 닥쳐서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삼가 조심하라.“
정도전 주장 따른게 많은 환란 초래?
이처럼 <삼한산림비기>에서는 스님의 말을 따르라고 했건만 결국은 정도전의 주장에 따라 백래 남향으로 궁궐을 지었으니 그 결과는 예언한 바와 같이 되었습니다.
5대도 못 내려가 왕위를 찬탈하는 변고가 일어났고(세조가 단종을 내몰고 왕위에 올랐는데 세조는 태조의 증손자이니 왕위로는 7대지만 가계로는 4대이다.)
‘200년 후의 대환란’은 임진왜란을 가리키는데 한양으로 천도한지 198년 만의 일입니다.
높은 것은 멀리 뻗친다고 했던가
송악의 보부상이 개성인삼을 가득 지고 임진나루에 당도하여 도강(渡江)을 기다리며 잠시 다리쉼하며 곰방대 빨며 지긋이 바라본 곳이 삼각산이었을 것이고, 백년서생 날건달이 문전옥답 처분하여 마련한 엽전을 괴나리봇짐에 꿰어 차고 한양에 말단관직 하나 돈 주고 얻어 차려고 한양 가는 길에 과천현감에게 돈푼 꽤나 주고 도성 안 힘깨나 쓰는 대감 소개받고 남태령 비껴가며 우면산 돌아서서 말죽거리 당도하며 처연하게 바라보았던 곳이 삼각산이었을 것이고, 강원도 첩첩산골 금강송 베어내어 임금님 사시는 곳 다시 짓는 목재로 사용하려고 정선 아우라지 포구에서 땟목 엮어 한양 길 떠난 땟목꾼이 양수리 지나 두물머리 어름쯤에서 불암산 너머로 아스라이 보았던 것도 삼각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여, 삼각산은 도읍으로 터를 잡은 이후 한양을 드나들던 백성들의 애환을 두루 포용하는 넉넉한 품을 지닌 으뜸 산(朝山)으로 역할을 다 해 온 것입니다.

- 최연 (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
젊은 시절 불교사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참으로 오랜 세월을 몸부림치다가, 혹여 변화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치에 잠시 기웃거리다가 나와서, 인문학에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 옛 동지들이 신대승의 기치를 내걸어 그 길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위해 국민운동체인 ‘민주주의 국민행동’ 기획위원장,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생존을 위해 사단법인 ‘해아라’이사장, 프레시안 인문학습원 서울학교, 고을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