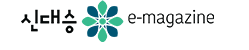서울 길을 걷다-27> 충절(忠節), 한강변을 거닐며 다시 새겨본다 (2)
인문/기행 - 최연 (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 2017. 제15호조선시대 최고의 풍류 장소로 꼽혔던 한강변의 전망이 좋은 바위언덕이나 봉우리에는 왕족과 사대부들이 정자를 많이 지어 한때는 80여 개가 있었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으며 그나마 위치가 확인돼 복원됐거나 표석이 세워진 곳은 14곳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원형이 남아 있는 한강변 정자는 용양봉저정(한강대교/본동)이 유일하며 복원된 정자는 효사정(한강대교/흑석동), 소악루(가양대교/가양동), 망원정(양화대교/망원동), 낙천정(잠실대교/자양동)의 네 곳이고, 표석이 세워진 정자 터는 화양정(영동대교/화양동), 압구정(성수대교/압구정동), 삼호정(원효대교/원효로), 천일정(한남대교/한남동), 제천정(한남대교/한남동), 심원정(서강대교/원효로), 담담정(양화대교/마포북단), 창회정(마포대교/원효로), 쌍호정(동호대교/옥수동)의 9곳이며, 서달산에 기대고 있는 정자는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과 효사정(孝思亭)이다.
용양봉저정은 배다리로 한강을 건넌 정조(正祖)가 어가(御駕)에서 내려 잠시 쉬면서 점심을 먹은 곳이다. 머물며 주식(晝食)을 했다고 해서 주정소(晝停所)라고도 하였고 임금이 머문 곳이라 용이 뛰놀고 봉황이 높이 난다는 뜻으로 용양봉저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정자는 선조 때의 중신 이양원(李陽元)의 집 터였는데 정조 때에 주정소로 이용되다가 고종 때 유길준(兪吉濬)에게 하사되었다. 다시 1930년대에 일본사람 이께다(池田)에게 넘어가 오락장으로 변질되었다가 광복과 함께 국유화 되었다. 현재 다른 건물들은 자취를 감추고 정자 한 채만이 외롭게 남아 있다.
효사정은 민제의 사위로 태종 이방원과 동서지간이며 16세에 음서로 출사하여 경기도관찰사, 한성부윤, 대사헌, 우의정을 지낸 노한(盧閈)의 별서(別墅)이다. 노한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侍墓)를 했던 자리에 정자를 짓고 가끔씩 올라가 모친을 그리워하고 개성에 있는 부친의 묘를 생각하며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달랬다. 본래의 효사정은 없어지고 있었던 자리마저 찾을 수 없어 일제 강점기 때 한강신사(漢江神祠)라는 일본의 신사가 있었던 자리에 새로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효사정이라는 이름은 노한과 동서지간인 이조판서 강석덕(姜碩德)이 지었고 그의 아들 강희맹(姜希孟)은 효사정기(孝思亭記)를 남기는 등 정인지(鄭麟趾), 서거정(徐居正), 신숙주(申叔舟), 김수온(金守溫) 등 당대의 문신 학자들이 효사정과 관련된 시문(詩文)을 남겼다.

소악루(小岳樓)는 양천현의 주산인 궁산에 세워진 정자이다. 한강의 경치와 강 건너 덕양산과 멀리 인왕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 좋은 곳으로 겸제 정선이 양천현감으로 있을 때 이곳에 올라 한강변의 좋은 풍광을 그린 그림이 화첩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망원정(望遠亭)은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이 별장을 지어 강상(江上)의 풍경을 즐기던 곳이다. 망원정이라는 이름은 성종 때 월산대군이 지었으며, 태종이 어느 날 농사를 시찰하러 이 정자에 나왔을 때 날이 가물던 중에 비가 흡족하게 쏟아졌다고 해서 희우정(喜雨亭)이라고도 불렸다. 이 곳은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던 연회장으로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륙 양군의 훈련장으로도 유명하였다.
낙천정(樂天亭)은 태종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 준 후 편히 쉬던 곳이다. 정자가 세워진 곳은 주위보다 약간 높은 지대여서 대산(臺山, 42.8m)이라 불렸는데 대산 서북쪽 모퉁이에는 이궁(離宮)도 지었다. 태종은 이곳에서 세종과 정사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좌의정 박은(朴訔 1370~1422)이 <주역>에 나오는 “천명을 알아 즐기노니 근심하지 않는다.(樂天知命故不憂 )”라는 글귀를 따 정자 이름을 낙천정이라 지었다고 한다.
화양정(華陽亭)은 태조 때부터 뚝섬의 말들이 떼 지어 노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 세종 때 지은 정자이다. 동지중추원사 유사눌(柳思訥)이 <주서(周書)>에 나오는 “말을 화산 양지에 돌려보낸다.(歸馬于華山之陽)”란 뜻을 취하여 `화양(華陽)`이라고 하였다.
압구정(鴨鷗亭)은 세조 때의 권신인 한명회(韓明澮)의 별장으로 명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예겸(倪謙)이 “부귀공명 다 버리고 강가에서 해오라기와 벗하여 지낸다”는 뜻으로 `압구정`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곳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한명회가 관직을 사퇴하고 이곳에 여생을 지내려 하자 임금이 압구정시(狎鷗亭詩)를 친제하여 하사하였고 조정 문신들도 차운(次韻)하여 그 시가 수백편이나 되었다고 한다.
삼호정(三湖亭)은 헌종 때의 의주부윤을 지낸 김덕희의 별장이다. 조선후기 여류시인들이 시회(詩會)를 열었던 곳이다. 기생출신의 김금원(金錦園)은 김덕희의 소실로 시문을 잘 지었다. 그녀는 1847년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기녀(妓女), 서녀(庶女) 출신 소실들로 '삼호정시사(三湖亭詩社)'를 만들어 삼호정에 모여 시회를 열었다.
천일정(天一亭)은 고려시대의 절터에 세워진 개인 소유 정자로 성종 때 황희 정승의 손자사위인 김국광이 처음 정자를 지었다. 이항복이 이 정자를 소유하였다가 조선 후기에는 민영휘의 별장이 되었다. 현판 휘호는 청나라 사람인 옹동화(翁同龢)가 민영휘에게 써준 글씨이고, 정자의 이름은 당나라 왕발의 <등왕각(藤王閣)> 서문에 나오는 “가을 물빛이 하늘빛과 함께 길다.(秋水共長天一色)”라는 시구에서 따왔다.
제천정(濟川亭)은 한남동에 위치했던 왕실 소유의 정자로 세조 2년(1456)에 세워졌다. 세조 때부터 명종 18년(1563)에 이르기까지 한강변 정자 가운데서 왕들이 가장 자주 찾은 곳으로 경도십영(京都十詠)에도 나와 있듯이 ‘제천완월(濟川翫月)’이라 하여 달구경하기 좋은 곳으로도 꼽혔다. 광희문을 나와 남도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선릉이나 정릉에 친히 제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러 쉬기도 하였고 중국 사신이 오면 언제나 이 정자에 초청하여 풍류를 즐기게 하였다고 한다.
심원정(心遠亭)은 임진왜란 때 왜군과 명나라가 화전 교섭을 벌였다는 정자로 용산구 문화원 부근 언덕에 그 터가 남아 있다.
담담정(淡淡亭)은 조선 초 안평대군이 지은 정자이다. 안평대군은 이 정자에 만 여권의 책을 쌓아두고 시회(詩會)를 베풀곤 했는데 이 정자에 거동하여 중국의 배를 구경하고 각종 화포를 쏘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영의정 신숙주의 별장이 되었다가 폐허가 된 터에 마포장(麻浦莊)이 지어져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이 잠시 머물기도 하였다.
창회정(蒼檜亭)은 조선 초에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주 놀러 다녔던 곳이며 한명회와 권람을 만나 대사를 논의하였던 곳이다.
쌍호정(雙虎亭)은 순조 8년(1808)에 출생한 조대비(趙大妃)의 생가 옆에 있던 정자로서 조대비가 출생할 때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정자 앞에 와 있었다 하여 쌍호정(雙虎亭)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이 일대는 자연 풍경이 빼어나 문인 명사들이 정자를 짓고 여가를 즐겼으나 1911년 경원선 철도 부설 이후 옛 정취는 거의 사라졌다.
서달산 서쪽 산록에 자리 잡은 달마사(達磨寺)는 유명한 선승 만공(滿空)스님의 제자인 유심(唯心)스님이 1931년 창건한 조계종 사찰로서 일제 강점기 때는 만공(滿空)스님께서 가끔 법문을 하셨던 곳이다.

서달산에 기대고 있는 국립현충원은 형국(形局)이 동작이 알을 품고 있듯 상서로운 기맥(氣脈)이 흐르는 것 같아 ‘동작포란형(銅雀抱卵形)’이라 하며 앞을 흐르는 한강수가 용트림하듯 흐르고 있어 지세를 한층 더 수려하게 뽐내게 한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단종에게 충절을 바쳤던 사육신의 제사를 모시던 육신사(六臣祠)가 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충절의 기상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국립현충원 안에 자리 잡은 호국지장사(護國地藏寺)는 신라 말에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창건한 갈궁사(葛宮寺)로부터 시작한다. 고려 공민왕 때 보인(寶仁)스님이 중창하고 화장암(華藏庵)이라 개명하였던 것을 조선시대 선조(宣祖)의 할머니인 창빈 안씨의 묘를 국립현충원 안으로 모시게 되자 화장암을 그 원찰(願刹)로 삼고 화장사(華藏寺)로 승격시켰다.
서달산 남쪽 산록에는 관우(關羽)를 모신 사당인 남관왕묘(南關王廟)가 있는데 일반인의 사당임에도 그 격이 매우 높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을 모시는 사당이 종묘(宗廟)이고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를 배향하는 사당인 대성전(大成殿)을 문묘(文廟)라 하듯이, 관우를 모신 사당을 관왕묘(關王廟)라 부를 정도로 같은 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관왕숭배 사상은 명나라 초기부터 성행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온 명나라 군사들로부터 퍼져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관우의 음덕(陰德)으로 임진왜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믿음이 전란 중에 조선의 병사들에게도 퍼져나가 민간신앙(民間信仰)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에는 관왕묘가 동대문 밖에 동관묘, 남대문 밖 도동에 남관묘, 명륜동에 북관묘, 서대문 밖 천연동에 서관묘, 종로네거리 보신각 뒤에 중관묘의 다섯 곳에 있었다. 하지만 동관묘만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고 남관묘는 일제가 목멱산에 조선신궁을 세우면서 헐어버린 것을 지금의 사당동으로 옮겨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다른 세 곳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동관묘는 특히 성균관의 문묘와 나란히 무묘(武廟)라 불릴 만큼 격이 높았는데 춘추(春秋)로 치러지는 대제(大祭) 때에는 임금이 손수 무복(武服)을 입고 참례를 할 정도였다. 지방에도 성주(星州), 안동(安東), 남원(南原), 강진(康津)의 네 곳에 관왕묘가 세워졌다.

- 최연 (사단법인 해아라 이사장)
-
젊은 시절 불교사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참으로 오랜 세월을 몸부림치다가, 혹여 변화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치에 잠시 기웃거리다가 나와서, 인문학에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 옛 동지들이 신대승의 기치를 내걸어 그 길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위해 국민운동체인 ‘민주주의 국민행동’ 기획위원장,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생존을 위해 사단법인 ‘해아라’이사장, 프레시안 인문학습원 서울학교, 고을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