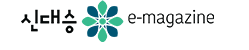불교 공론장의 위기! 편견을 정견으로, 방관을 협동으로 타개하자.
편집진 편지 - 편집위원회 | 2016. 제1호- 신대승 이-매거진을 창간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999년 6월 24일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런 언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지난 20일 공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70위에 그쳤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를 찍은 뒤, 2009년 69위까지 주저앉았다가 이번에 최하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보도되고 있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에 대해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RSF는 언론 독립성, 자기검열, 법치, 투명성 등의 다양한 지표로 순위를 매긴다.
교계의 사정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욱 노골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조계종 집행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있는 듯하다. 조계종단이 일부 비판적 매체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고 취재와 광고를 금지시킨 지 240여일을 넘기고 있다. RSF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더불어 눈금 없는 주관적인 해종의 잣대를 들이대며 불교인으로서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조치는 타당한 사회적 혹은 종단적 법률의 근거 또한 불분명하다. 최근 년 간, 그리고 근래에 들어 특히 종단은 전시적(展示的)인 정보 이외에 종단 기초통계 같은 기본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어 투명성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조계종 집행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있는 듯하다. 조계종단이 일부 비판적 매체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고 취재와 광고를 금지시킨 지 240여일을 넘기고 있다. RSF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더불어 눈금 없는 주관적인 해종의 잣대를 들이대며 불교인으로서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조치는 타당한 사회적 혹은 종단적 법률의 근거 또한 불분명하다. 최근 년 간, 그리고 근래에 들어 특히 종단은 전시적(展示的)인 정보 이외에 종단 기초통계 같은 기본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어 투명성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이런 상황이 불교인들에게 주는 해악은 실로 막대하다.
우선, 종단의 해종언론 규정은 해종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으로 편 가르기를 함으로써, 그 자체로 모든 언론매체의 주장과 기사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대중의 객관적인 평가를 왜곡시킨다. 그럼으로써 사실과 진실에 대한 대중의 주체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를 질식시킨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인 여실지견(如實之見)을 가로막고 종국에는 정견(正見)을 향한 불자들의 수행을 해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불교인들의 참여의식을 저해하고 불자대중을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방관자로 만들어, 종국에는 전법역량의 결집을 가로막는 후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부처님께서 불법의 융성과 영속을 위해서는 ‘자주 모여서 토론하라’고 가르치신 바, 그와 같은 숙의의 장, 공론장(公論場)을 궤멸시킨다. 불법과 종단발전을 위해 열정을 태울 의지가 있는 이들은 자신의 주장과 재주를 드러내길 포기한다. 그럼으로써 결국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자조 섞인 현실을 만들어낸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애종적으로 접근하였더라면 현실 공론장의 주체적인 개선과 변화,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동력을 형성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을 그르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직 비관하기에는 이르다.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투명한 숙의의 장, 공론장을 정상화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전제조건은 있다. 그것은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앞으로 향해가는 길을 잡고, 과거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발상과 방법의 혁신을 통해 현실을 타개할 방책을 찾아야 한다. 대중이 냉소와 회의를 걷어 낼만하다 생각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낼 어떤 수단을 창안하여 제공하고 대중과 성실한 상호의사소통을 해가야 한다.
이 길의 마중물 역할을 신대승 e-매거진이 하고자 한다. 강호제현들의 지혜로운 경책을 기대한다.

- 편집위원회
-
우리는 중생의 고통에 무관심한 불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새기고자 하며, 또한 기성불교가 붓다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을 때 불교는 어김없이 자기 혁명을 이루어 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대승불교는 그렇게 일어난 붓다 회복운동이었고, 시대와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로서의 자기 혁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