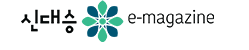우리가 잘 모르는 기후변화 이야기 3
생명/생태/기후 - 민정희 (INEB 이사) | 2016. 제6호
숲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소중한 자원이다. 숲은 빗물을 흘려보내고 저장함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나무가 많은 산에서는 빗물의 35%가 지하수로 흐르지만, 민둥산에는 10%만이 지하수가 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숲이 머금은 물의 양은 연간 180억 톤으로, 소양강댐이 저장하는 수량의 10배에 해당된다. 그래서 산림 전문가들은 숲을 ‘녹색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숲은 또한 잎의 표면에서 수분을 수증기 형태로 내뿜는 증산활동을 통해서 기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여름에 숲 속 온도는 주변 지역보다2도 가량 낮은 반면, 겨울에 숲은 주변 보다 2도 가량 높다. 특히 잎의 표면적이 넓은 침엽수는 활엽수보다 증산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 침엽수림이 활엽수림보다 온도가 더 낮다.
무엇보다 중요한 숲의 기능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생명이 숨 쉴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숲이 훼손되고, 나무가 죽으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숲을 보존하거나 더 많은 숲을 조성하는 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일이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라지는 숲이 늘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산불로 인해 숲이 파괴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엘 니뇨까지 가세해 숲의 파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온도에 예민해서 지구온난화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리는 침엽수의 고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로스 앨라모스 관측소는 5년간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미국의 소나무, 향나무가 이번 세기 말이면 사라질 것”이라며 북반구의 침엽수도 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침엽수가 고사하는 메커니즘은 이렇다. 날씨가 가물어지면 침엽수는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물의 증산을 막기 위해서 바늘모양의 잎 끝에 있는 기공(숨구멍)을 막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무가 흡수해야 할 이산화탄소도 함께 흡수할 수 없게 만든다. 즉,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침엽수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게 되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다.
가뭄이 길어져서 공기가 더욱 더워지고 건조해지면, 공급되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을 뿌리로부터 끌어올리기 위해서 침엽수의 체내 수분 장력이 너무 커지게 되고, 이 때문에 지푸라기 같은 물기둥이 더 이상 물의 흐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된다. 따라서 침엽수의 수압시스템이 망가지거나 나무가 탄소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물질인 수액 또한 분비할 수 없게 되면서 침엽수에 가장 해로운 병충해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국, 침엽수의 손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의 본래 기능을 잃게 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침염수림에도 이러한 손실 현상이 최근 몇 년 전부터 감지되어 왔다. 올해 9월 녹색연합은 소백산, 오대산, 태백산 등 백두대간에서 분비나무와 같은 고산침엽수가 집단 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주능선이 지나가는 오대산 일대에서 분비나무 가운데 70%가 완전히 말라 죽었고 나머지 30%는 고사가 진행 중이며, 태백산에서는 60%, 소백산에서는 50%의 분비나무가 완전히 고사했다는 것이다.

온도상승으로 잎이 말라가는 전나무 (출처 : blogs.cornell.edutreeipm)
이미 한라산에서는 구상나무의 34%가 집단 고사하였고 열대성 해충인 재선충으로 인하여 그 동안 900만 그루의 소나무가 사라졌으며, 70년 후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침엽수가 사라진 곳에 난대성 활엽수가 자라나 100년 이내 한반도의 산림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다.

온도상승으로 잎이 말라가는 소나무 (출처 : blogs.cornell.edutreeipm)
현재까지 남한에서 고사한 침엽수는 35%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겨울철의 기온상승과 겨울철 강수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난 20여 년간 겨울철 평균기온이 2도까지 올라갔으며 눈이 적게 내려 침엽수가 심한 수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는 것이다. 침엽수는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 등 생리적인 대사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물이 필요하다. 이때 수분 공급이 안 될 경우 죽게 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의 추세를 보면 겨울철과 봄철은 강수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했다. 이렇게 봄, 겨울철 고온과 가뭄이 겹치면 활엽수보다도 침엽수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침엽수는 나무가 곧게 자라고 같은 기간 활엽수보다 생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목재로 많이 이용된다. 침엽수는 활엽수보다 기온에 민감하고 오염물질을 덜 흡수함에도 불구하고 목재활용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청은 산림을 조성할 때 침엽수를 선호해왔고 전체 삼립 가운데 침엽수림이 43%를 차지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숲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숲이 손실되면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생태계와 숲의 생물다양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숲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엽수의 고사 현상과 더불어 숲의 식생 변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온난화에 적응하는 한편 탄소 흡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수종의 식재와 산림조성이 필요하다.

- 민정희 (INEB 이사)
-
대불련 지도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노동위 간사,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협력국장,로터스월드 사무국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홍보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기후생태(ICE)네트워크> 사무국장, INEB 이사, 아시아불교씽크탱크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2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종교간대화’ 참석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