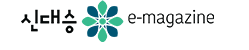견맹주산(犬猛酒酸)
식당에는 밥 먹으러 가고, 술집에는 술 마시러 간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교회당에는 설교 들으러 가고, 절집에는 절하러 간다. 당연한 말 같기는 한데 좀 밑지는 느낌이다. 절집에서도 법회를 열고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다. 교회당에서도 108배에 버금가게 절절한 새벽 통성기도를 하지 않는가? 식당에서 술도 마시고, 술집에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식당에서 쉰밥을 주면 그 식당은 끝이다. 어떤 논리적인 변명도 필요 없다.
나는 어려서 독실한 청교도적인 집안에서 자랐지만 교회당을 가본지 오래됐다. 중학생 때 가본 것이 마지막인 듯하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설교가 거북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어쩌다가 달변의 목사나 전도사를 만나 대화를 할 때가 있다. 그들은 대부분 신념에 차있고 선해 보인다.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거북해지는 경우가 많다.
신념에 차서 주장하는 말들은 한편으로 일리(一理)가 있는 경우가 많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리가 있는 말은 일단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일리를 진리라고 자꾸 우기면 뱃속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목구멍이 막힌다. 말이 끊어진 자리에 찬바람이 분다. 더 이상 의미 있는 대화는 불가능하다.
어릴 때 가본 절은 어색하고 무서웠다. 절이 친근해진 건 대입재수생일 때였다. 재수생활 몇 달을 도서관으로 향하다가 점점 게을러져 도서관 정문 앞에서 가방을 줄 세워 대기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발길을 돌려 아무 버스나 타고 변두리로 나가면 어김없이 산기슭에 절이 있었다. 2번 버스종점 정릉 경국사, 84번 수유리 화계사, 8번 북한산 도선사, 103번 관악산 삼막사, 63번 강남 봉은사, 13번 도봉산 망월사, 회룡사 등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주 가다보니 공짜로 점심 공양하는 것도 익숙해졌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머리를 빡빡 밀었으니 스님들도 그렇게 낯설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시절 어느 가을날에 나는 북한산 도선사에서 강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절 한 켠 마당에서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절을 하고 있었다. 푸르디푸른 가을 하늘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속에서 이 땅의 어머니들이 끝도 없이 절을 하며 자식의 대입합격을 기원하는 백일기도를 드리는 풍경은 생뚱맞게도 경이롭고 아름다웠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습지만 나는 그때 불문(佛門)에 발을 들인 것 같다.
나는 절이 좋다. 절에 가면 고향집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하다. 절에서는 내 맘대로 하더라도 어색하지도 어긋나지도 않았다.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나는 조계사 앞 우정국 공원에서 지인들과 함께 49일 동안 매일 저녁에 추모시민마당을 열었고, 마지막 날에는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추모문화제를 지냈다. 그때 스님들도 종무원들도 신도들도 모두 동지였다. 조계사가 아니었다면 어디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지금 나는 조계사에 가면 마음이 거북하다.
견맹주산(犬猛酒酸)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술이 있는 술집에는 술꾼들이 알아서 간다. 말이 통하는 주모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런데 술이 좋아도 술집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술꾼들은 발길을 돌린다. 술집에서 키우는 개는 어찌됐든 주모의 아바타이다. 술집에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